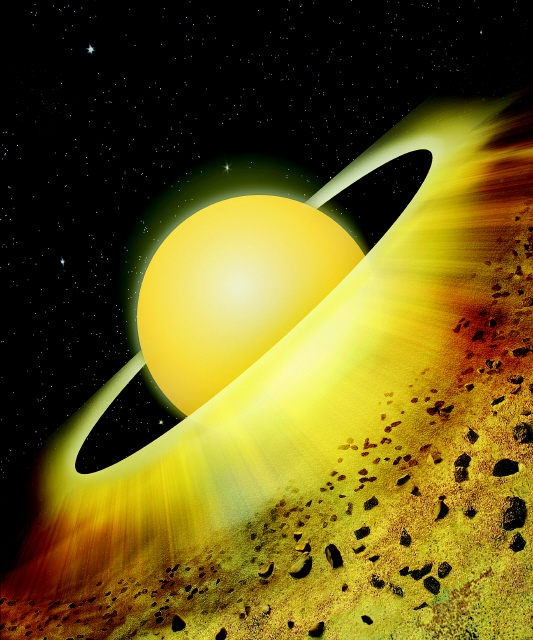| 태초에 우주가 ‘얼떨결에’ 창조됐으니 | |
| 주류 물리학계 ‘대칭론’에 반기 ‘비대칭’ 우주의 불완전성 강조 “만물의 원리 존재한다는 기대 종교적 믿음 근거한 망상일뿐” | |
 | |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죽는 날까지도 ‘만물의 이론’과 씨름하고 있었다. 상대성이론으로 시공간을 통합한 이 천재 중의 천재가 끝내 풀지 못한 만물의 이론은 ‘최종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말 그대로 모든 만물(萬物)의 단일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최종의 궁극적인 이론이겠다. 그런데 이 최종 이론으로 나아가는 길목에는 ‘대칭’이라는 말이 놓여 있다. 다수의 현대 물리학자(수학자)들이 만물의 최종 이론을 여는 열쇠로 인식하는 개념이 대칭이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나. 우주에는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까. 물질과 생명의 근본 구조는 무엇인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자연과 우주라는 물리적 세계의 비밀을 하나의 ‘최종 이론’으로 풀려는 열망은 알고 보면 2500년 서구 과학사의 이력을 지닌 것이다. “만물은 하나의 물질로 이뤄져 있다”고 선언했던 고대 철학자 탈레스의 길을 따라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 케플러, 뉴턴,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가 뒤를 잇는다.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일하려 했던 아인슈타인 이래, 자연(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의 통일을 추구해온 초끈이론, 초대칭이론 등 유수의 통일 이론 주창자들이 그러하다. 이 통일이론의 기반을 이루는 인식은 자연과 물질, 생명의 근본 구조에는 대칭성이 있으며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계보를 잇는 미학적 판단이 들어 있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곧 아름다운 것이 진리이며 진리는 아름답다는 생각이다. 나비가 아름다운 건 그 두 날개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이며 방정식도 인간의 몸도 좌우 대칭하기에 아름답다는 관념이다. <최종 이론은 없다>는 그 생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 “대칭성은 여전히 물리학의 핵심도구이지만 지난 50년간 실험물리학의 발견이 보여주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대칭성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실제라기보다는 기대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대칭성이라기보다는 비대칭성이다!” 물질과 우주는 비대칭이며 따라서 시간도, 생명도 비대칭이다. 완벽한 대칭은 알고 보면 아름답지 않으며 현실에서 사람들은 살짝 비대칭인 얼굴을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마릴린 먼로의 얼굴에 박힌 점처럼 미세한 대칭의 깨짐, 그 균열이 빚어내는 비대칭이야말로 아름답다. 이런 새로운 미학을 펴면서 지은이는 물질과 생명의 기원에 이르는 모든 구조의 출현에는 비대칭성의 존재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칭 이론 신봉자들이 완벽한 대칭성을 표현하기 위해 강력한 방정식을 써나가지만, 기왕의 수학·물리학의 성과들이 드러내듯이 거기서 나온 해답은 ‘불완전한 실재의 근삿값’에 지나지 않는다. 비대칭성으로부터 불균형이, 불균형으로부터 변화가, 그리고 변화에서 생성이 나온다. 즉 구조가 출현한다. 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입자물리학의 근본 대칭성 중에서 일부가 깨져야만 한다. 물리학의 성과들을 들여다보면서 지은이는 “우리 우주는 약 137억년 전 진공에서, 일종의 무시간적 영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작위적 양자 요동의 결과”이리라는 가설을 소개한다. 생명은 계획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암흑물질 속에서 은폐된 수소 구름들은 자체 중력으로 붕괴해서 최초의 별과 은하들을 형성했다. 그로부터 수십억년 뒤에 하나의 별(태양)의 주위를 도는, 물이 풍부한 어느 행성(지구)에 생명이 출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모였다. 태고의 진흙 속에서 서로 결합한 분자들이 합체해서 최초 생명체가 되었다.” 지은이는 나아가, 최종 이론의 꿈을 “과학의 렌즈를 통해 신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최종 이론은 전일성에 대한 종교적 믿음의 과학적 등가물이다. 현대 물리학은 과학의 이름으로 창조론(일신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케플러가 신의 이름으로 과학을 했듯이, 그 물리학이 표방하는 근저에는 뿌리깊은 일신론적 관념, 곧 전일성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다양성 저변에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실체가 있다는 전일성 사상이 고대에 이집트, 중동에서 태동한 뒤 지중해를 넘어 퍼져나갔고 기원전 600년께에 그리스에서 이런 종교사상들이 철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신론적 전일성 관념에서 보면 생명은 신이 계획하여 창조한 것이기에 우연이 아니며, 신이 완전한 까닭에 신이 창조한 세계도 완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지은이가 보기에, ‘창조’의 순간에 ‘균열’이 있었으니, 그 균열, 곧 물질과 시간의 원초적 비대칭성이 생명의 탄생으로 나아간 것이다. 만물이 생겨난 근원은 근본적 불완전성에 있다는 것이다. “잘 정의된 초수학적인 구조가 있어서 우주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식은 물리적 실재와는 아무 관련 없는 플라톤적 망상에 불과하다.” ‘수학과 우주의 완전한 일치’라는 생각에 매혹됐던 독자라면 지은이의 생각을 수긍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이 책과 정반대 입장에서 수학적 대칭의 아름다움이 자연과 우주의 아름다움에 맞닿아 있다고 말하는 책 <아름다움은 왜 진리인가>(이언 스튜어트 지음·승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책을 읽는 짬짬이 함께 읽으면 좋겠다.
| |||||||||||||||||||||
'프 로 필 > 저 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잡스가 세상을 뒤흔든 비결 (조선일보 2010.11.27 03:01) (0) | 2011.02.18 |
|---|---|
| <천하의 건달 유방이 황제가 된 비결은> (연합뉴스 2011/01/27 09:26) (0) | 2011.01.27 |
| 알라가 고통에 굴복하라면, 나는 알라를 거부하겠다` (조선일보 2010.10.09 03:01) (0) | 2010.10.10 |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동물 임상검사 매뉴얼 발간 (0) | 2010.09.25 |
| 해양의 종합적 관리를 생각한다 (국토해양부 2010-07-01 15:14) (0) | 2010.09.12 |